『일의 감각』 — 반쪽짜리 오너십을 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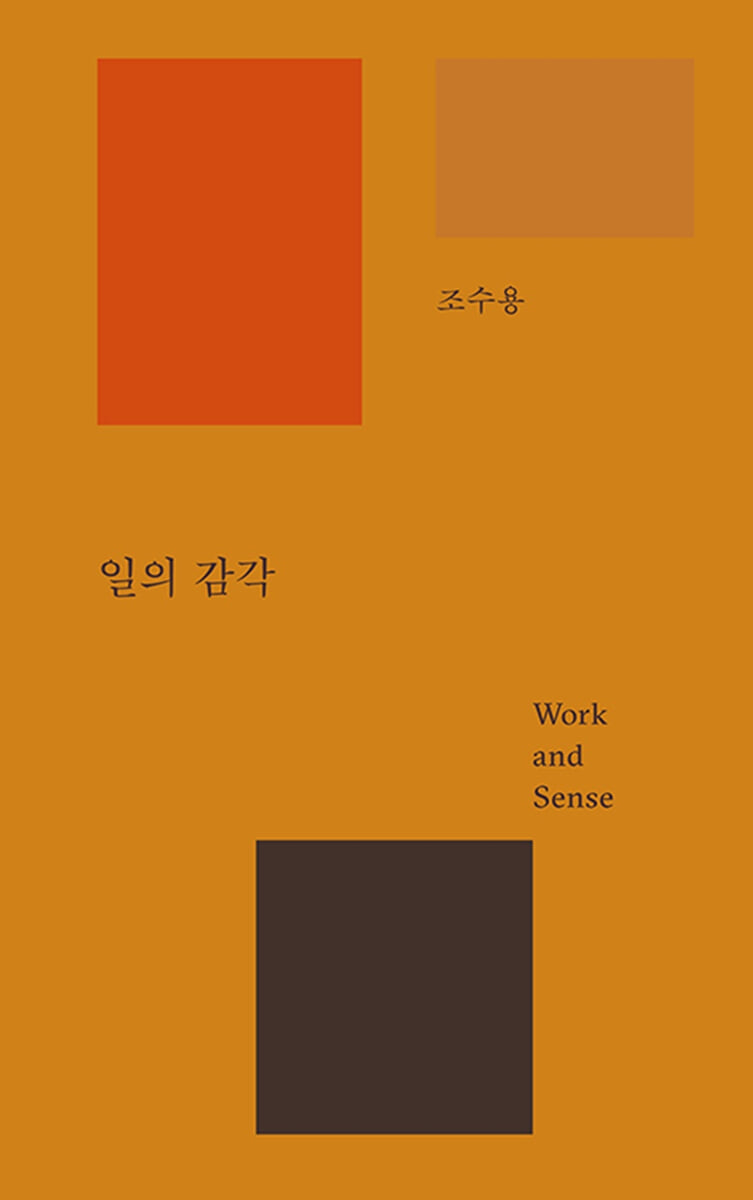
오너십을 다시 생각해보다
길지 않은 커리어 내내 나를 따라오는 평가가 하나 있다. '맡은 일은 어떻게든 끝까지 해낸다'는 것.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책임감이라는 단어로 대표할 수 있는 문장들이다.
그렇다, 주어진 일은 최선을 다 했고 방식이나 코드의 효율성 문제는 차치하고 대부분 완수해냈다. 그것을 오너십이라 여겼고 어떠한 조직에 속하면 응당 해내야할 밥값 같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스스로를 오너십이 있다고 여기곤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맡은 일을 성실히 해낸다. 적어도 나의 작은 경험 내에서는 일을 대하는 태도에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일정이나 의사소통 같은 외부 요인들이 일을 어렵게 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내가 오너십이라 부르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 단지 일을 완수하는 능력을 오너십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골똘히 생각해보면 책임감과 오너십은 다르다. 그리고 둘 다 단지 일을 끝까지 해내는 것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나는 이 책을 통해 오너십이라는 단어를 다시 들여다보게 되었다.
저자는 여기서 오너십을 오너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몰입하는 마음과 업무에 대한 주인 의식으로 표현한다.
‘오너십을 가지라’는 말은 마음만 그렇게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내가 맡은 일의 주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러려면 첫 삽을 뜨고, 마지막 흙을 덮는 일까지 직접 살피려 노력해야 합니다. (p.40)
그간 내가 가졌던 오너십은 맡은 업무에 한정된 반쪽짜리 주인 의식에 가까웠다고 볼 수 있겠다.
오너십은 어디에서 오는가
내가 가진 오너십이 업무 단위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범위를 넓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그것은 신뢰와 공감에서 온다. 저자는 여기서 회사가 직원에게 신뢰를 가지면 그 직원의 의견에 힘이 실리고 생각을 펼칠 수 있다고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오너보다 오너십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오너의 신뢰를 얻으려면 오너의 고민을 내가 대신 해주면 됩니다. (p.25)
공감이라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라면 ‘돕고 싶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싶은 따뜻한 마음이 있을 때 공감의 수준은 높아집니다.
(중략) 나에게 주어진 일, 정해진 일만 보려고 하면 정작 진짜 중요한 일을 못 볼 때가 많습니다. (p.31)
저자의 말처럼 오너십은 공감과 신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여기서 조심해야할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오너십이란 단어엔 명과 암이 있다. 때로는 팀원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명분으로 쓰이기도 한다.
"난 회사의 주인이 아닌데?"
이 반응은 이상하지 않다. 직원은 회사의 주인이 아니다. 권한 없이 책임만 주어진다면 그것은 오너십이라 부를 수 없다. 오너십은 강요로 생기지 않는다. 조직의 비전과 방향에 공감하고, 적절한 권한과 책임, 자율성이 주어질 때 비로소 힘을 얻는다 생각한다.
감각은 만들어진다
우리는 남다른 성과를 내는 사람을 보며 쉽게 재능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 감각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과 태도의 결과이다.
그렇다면 감각은 어디에서 탄생하는가.
개인의 철학이 반영된 취향은 방향을 만든다.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쌓일수록 선택은 선명해진다. 그리고 그 방향이 타인과 만날 때 공감이 생긴다. 공감은 나의 취향을 타인의 세계와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 그렇게 취향과 공감이 겹쳐질 때, 감각은 조금씩 단단해진다.
내 취향을 깊게 파고, 타인에 대한 공감을 높이 쌓아 올린 결과 만들어지는 것이 ‘감각’이라 생각합니다. (p.51)
감각은 단순히 좋은 것을 알아보는 능력이 아니다. 나의 기준을 세우고, 타인의 기준을 이해하며, 그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려는 태도의 축적에 가깝다.
그런 관점에서 오너십은 감각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다. 타인의 고민을 이해하려는 태도는 공감을 훈련하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 훈련의 결과로 저자의 말처럼 중요한 일을 통찰할 수 있는 감각이란 것이 생기게 되지 않을까.
그러나 오너십만으로 뛰어난 감각이 뿅하고 탄생하지는 않는다. 상식적이고 기본적인 생각에서 모든 일을 접근하는 것이 오너십으로부터 출발한 감각을 이어지게 해준다.
감각적인 기획을 생각해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가장 상식적이고도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P.149)
세상에 원래 그런 건 없습니다. 빵 한 조각을 봐도, 도시의 빌딩을 봐도 왜 그런지 끊임없이 물어야 합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것, 그게 바로 감각의 핵심입니다. (p.154)
어떻게 살 것인가
반쪽짜리 오너십을 갖고 살아온 내게는 나머지 반쪽을 찾는 일이 남았다.
최근 두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단순했다.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에 공감했고, 그 방향이 내게는 재밌는 일로 느껴졌기 때문이다. 나는 재미 없는 일이 오면 억지로라도 의미를 찾아내는 사람이다. 그러나 회사 생활은 때로 비효율과 갑갑함을 동반한다. 하나의 톱니바퀴로 살아가다 보면, 처음 공감했던 비전은 흐려지고 주어진 일만 남는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 회사를 선택했는지조차 잊게 된다.
연애로 치면 권태에 가깝다고나 할까. 하지만 권태가 곧 이별을 의미하지는 않듯, 떠남보다 중요한 건 다시 묻는 일이다. 내가 공감했던 가치와 방향을 의식적으로 되짚는 훈련. 훈련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대개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철학을 갖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케팅 컨셉으로 ESG를 말한다고 개념 있는 브랜드로 보이지도 않고, 이익을 추구한다고 나쁜 브랜드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보다 뭐든 소신 있게 자신의 철학을 끝까지 지켜내는 게 중요합니다. 즉, 브랜딩의 다른 말은 ‘소신을 찾아나서는 과정’입니다. (p.198)
저자가 말하는 브랜딩은 결국 삶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처럼 들린다. 나는 어쩌면 셀프 브랜딩에 목마름이 있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다.
장차 무엇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다. 개발을 계속할지, 다른 길을 택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이 좋아해줄 때의 기쁨을 나는 알고 있다. 일의 주인이 되어 나의 철학과 세상의 접점을 찾는 삶, 구체적으로 무엇이든 그런 여정을 떠나게 될 거 같다.